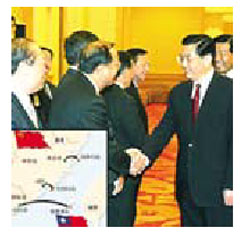|
2001년 1월2일 오전 11시 중국 푸젠성 푸저우항. 승객 500여명을 태운 대만 여객선이 항구에 들어섰다. 1949년 이후 단절된 중국과 대만간 직교류가 52년 만에 이뤄진 순간이다. 다른 대만 선박 두 척도 푸젠성 내 연안항구를 찾았다. 양안(兩岸)에 새해벽두부터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소삼통(小三通)이라는 대만의 결단 덕분. 소삼통은 대만의 3개 섬과 중국 푸젠성 연안도시간 직항로를 연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는 반세기를 끌어온 중국과 대만간 밀고 당기기의 접점이다. 소삼통의 근원은 국민당 정권이 대륙에서 쫓겨난 직후 발표한 삼불통(三不通) 원칙. 공산당과 통상ㆍ통운ㆍ통우(서신교환)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1980년부터 삼통(三通)을 역제의하며 대만을 압박해왔다. 대만은 20년이 지나 삼통을 일부 수용, 소삼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한된 교류라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넘는다. 양안교역은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른다. 가끔씩 불거지는 긴장에도 교류는 갈수록 늘어간다. 대만인의 중국 방문은 연간 500만명이 넘는다. 항공편 직항로도 열렸다. 최근에는 대만의 자본과 기술, 중국의 노동력이 맞물린 반도체 합작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공(國共) 합작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포위하는 구도다. 부동산 거품 붕괴론에도 국제 자금은 대만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말 대만증시의 자취엔지수는 올해 양안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호재를 타고 6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정작 중국인들은 느긋하다. 50년 넘게 이어진 삼불통과 삼통이라는 형식적 대립 아래 소삼통으로 실리를 챙기는 구조 속에서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慢慢的)가 읽혀진다. 소삼통의 끝은 어디일까. 부럽고 두렵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