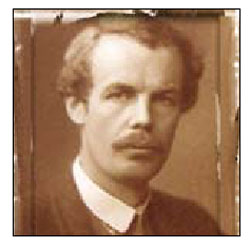|
[오늘의 경제소사/3월7일] 피구 & 후생경제학 권홍우 편집위원 피구(Arthur Cecil Pigou). 케인스(Keynes)에게 밀려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지만 성장과 분배의 조화, 환경 문제 등을 고민했던 거장이다. 피구는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1877년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1904년부터 모교인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강의를 시작, 31세 때는 스승 알프레드 마셜의 후계자로 지목돼 1943년 은퇴하기까지 영국 경제학을 이끌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강조했던 마셜처럼 피구는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침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국내에서는 부의 편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때 피구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놓고 머리를 싸맸다.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ㆍ1920년)’이다. 후생경제학의 특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경제학 태동의 토양을 제공했던 공리주의 철학과 애덤 스미스 이후 영국 경제학을 결합했다는 점. 피구는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대공황기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각광받지 못했지만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남아 있다.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케인스와 벌인 논쟁도 유명하다. 1859년 3월7일, 82세로 세상을 떠난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영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파묻혔지만 양극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기후문제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