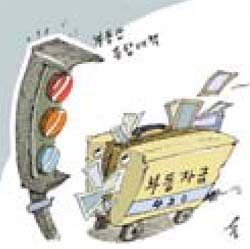|
돈 없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 떠돌며 사는 주거 방식으로 인식돼 온 이동식 조립 주택. 미국 일부지역에서 이 집값이 최고 200만 달러(20억원)를 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지난 주 나왔다. USA투데이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침실과 화장실이 각각 2개인 이동식 조립 주택이 최근 130만 달러에 매매됐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광풍이 휘몰아친 지구촌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례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5년간 평균 주택 상승률은 100%.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서 5년 만에 주택 값 2배 폭등은 이론으론 설명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광풍도 이제 슬슬 휩쓸려 빠져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상하이가 먼저 폭탄을 맞는 가 싶더니 호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구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는 이제 올 것이 오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갖게도 한다. 이미 부동산 과열에 대해선 ‘늑대와 소년’의 얘기가 될 만큼 많은 경고가 나온 상태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뒤 돌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지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의 2배 손실을 입을 것“ 로이터의 이 같은 주장에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미국 집 값이 한 단계 하락하는 정도의 조정에도 내년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포인트 낮아질 거란 경고로 맞장구를 쳤다. 투기에 쏠렸던 부동 자금들의 부동산 시장 이탈은 또 한번의 늑대와 소년의 얘기로 끝날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언젠가 끝장이 날 것이다.” 허브 스타인 전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의 유명한 말을 생각케 하는 시점이다. ▲언제나 투기의 광풍 한가운데 숨어있는 부동자금. 일정한 자산 형태로 붙박여 있지 않고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유동하고 있는 보통 6개월 미만의 단기성 대기 자금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 한국시장에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의 추정 규모는 줄잡아 420조원. 사상 최저 수준 금리 상황속에 사상 최대로 불어난 이 뭉치 돈들이 부동산을 필두로 외환, 원자재, 각종 펀드 등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난 곳들을 옮겨 다니며 ‘돈 쓰나미’를 만들고 있다. 이들 단기 부동자금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 자본화하면서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며 각종 사회 문제까지 양산시키고 있다.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한 백가쟁명(百家爭鳴) 속에 금리 인상은 경기 불씨의 싹을 밟아버릴 지 모를 가능성으로 여전히 논란의 상태다. 금리는 그렇다 해도 그러나 넘치는 돈을 생산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건 하루바삐 서둘러야 할 정책일 듯 싶다. 자금의 증시 유인과 함께 무엇보다 설비 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된 자본 시장으로의 유도를 통한 자금의 선 순환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갈 길을 못 찾는 돈들을 투자로 연결시키면 경기 진작과 함께 주가 상승의 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 지금처럼 경기는 나쁘고 기업 실적도 안 좋은 데 자금 이동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불안한 상태도 개선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대통령이 나서 한판 승부의 불타는 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지금 이 사회의 투기 심리는 치료가 난해한 중병의 상태다. 부동자금 길들이기. 정권이 머리를 싸매고 덤벼들었던 문제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 투기 자금을 향한 온갖 ‘센’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음달 또 한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