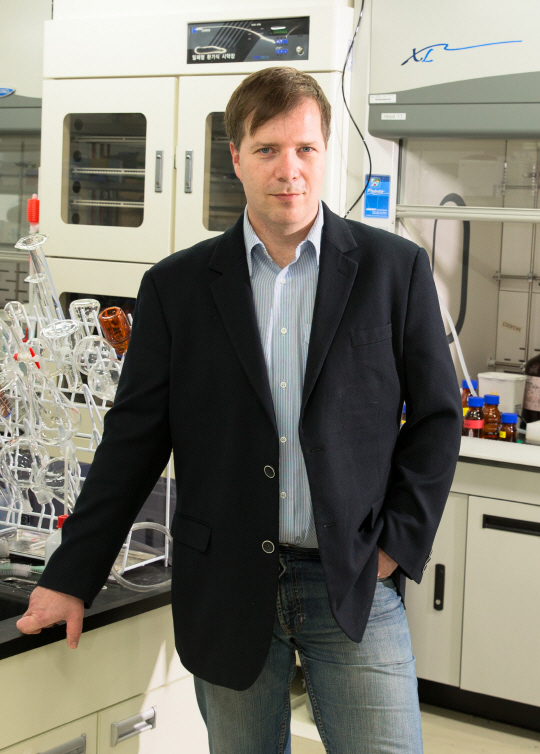반도체가 아닌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해 전자소자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이 대학 자연과학부의 바르토즈 지보브스키(Bartosz Grzybowski)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전하를 띠는 분자로 기능화시킨 금(Au) 나노입자를 이용해 처음으로 반도체 물질 없이도 회로 및 센서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UNIST에 따르면 반도체 칩은 전자기기에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필수 부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물기가 있으면 회로가 망가지고 만다. 또 유연하지 않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wearable) 전자소자를 개발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자들은 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는 물질과 유연한 전자소자(flexible electronic devices)에 쓰일 새로운 물질을 찾아왔다.
지보브스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습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유연한 전자소자로도 만들 수 있는 ‘전하를 띠는 금속입자’를 선보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는 분자로 각각 코팅한 금 나노입자를 맞붙여 한쪽으로만 전자가 흐르는 소자(다이오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전자의 방향성을 만드는 다이오드(diode)와 같은 기능이다. 이 소자를 응용하면 복잡한 회로를 설계해 센서나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다.
지보브스키 교수는 “양전하를 띤 부분과 음전하를 띤 부분을 붙이면 이온 이동이 일어난다”며 “이온들은 물에서도 잘 확산되므로 반도체 회로와 달리 물기가 있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금 나노입자 층으로 만든 단순한 회로를 응용해 3가지 논리 게이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AND(A 그리고 B), OR(A 또는 B), NOR(A도 B도 아닌) 세 경우에 각각 다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논리회로는 유연한 기질 위에 만들 수 있었고 심하게 휘어져도 작동했다.
지보브스키 교수는 “금속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반도체와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금 나노입자에 전하를 붙이는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반도체 회로에서 못하던 기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기술은 습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논리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촉망받는 접근법”이라며 “추가적인 공정이 개발된다면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하듯 금 나노입자를 층으로 쌓아 복잡한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노로지(Nature Nanotechnology) 3월 14일자 온라인 판에 공개됐으며, 4월호에 출판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