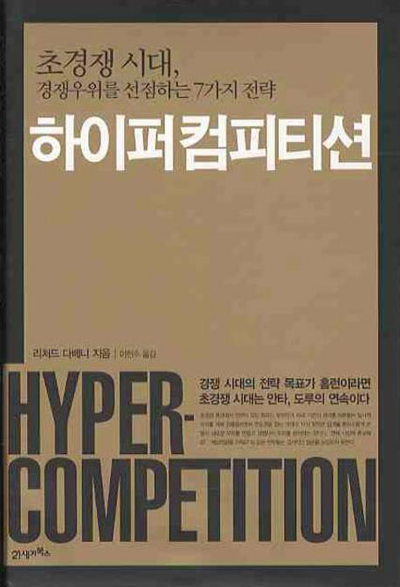|
자동차 업계를 장악했던 GM이 최근 파산보호신청을 내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불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다가서면 전통적인 의미의 절대우위, 즉 난공불락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다트머스 경영대학원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가르치는 저자는 이 같은 공격적인 무한 경쟁 상태를 ‘초경쟁(Hypercompetition)’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한다. 전략 집중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초경쟁 환경에서 영원한 승자란 없다. 모든 우위는 누군가에 의해 잠식되기 마련이고, 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MS)는 초경쟁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1992년 이미 PC운영시스템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MS는 차세대 프로그래밍인 윈도우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즉 자신이 확보한 우위를 고수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그 우위를 무너뜨리려 애썼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기업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이다. ‘성공은 기업이 얼마나 크느냐’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다음 번 경쟁 우위로 옮겨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경쟁과 우위 차지의 요인으로 ▲원가와 품질 ▲타이밍과 노하우▲진입장벽과 거점 ▲풍부한 재원의 4가지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꼽혔다. 하지만 원가와 품질로 확보한 강력한 브랜드일지라도 초경쟁 환경에서는 품질을 높였음에도 가격을 낮춰야 했다. 타이밍과 노하우 면에서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디자인 주기도 짧아졌다. 제품수명 주기가 5년이었던 컴퓨터 신모델은 이제 6개월마다 바뀌고 과거 10년마다 새 모델이 나오던 자동차는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등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과거에는 경쟁우위의 확실한 원천이던 풍부한 재원 역시 별 무기가 되지 못한다.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재력있는 경쟁사와 맞서기 때문이다. IBM은 인텔과의 제휴로 칩 제조업계를 지배했고 인텔이 너무 강해지자 애플, 모토로라와 손잡는 식으로 차세대 칩 개발에 몰두했다. 덕분에 풍부한 재원을 갖춘 NEC나 일본 재벌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저자는 기존의 상태를 뒤흔들어 일시적 우위를 계속 창출함으로써 주도권을 잡는 것이 초경쟁 환경에서 가져야 할 전략 목표라며 ‘동적인(dynamic) 전략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책은 이를 심화한 7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