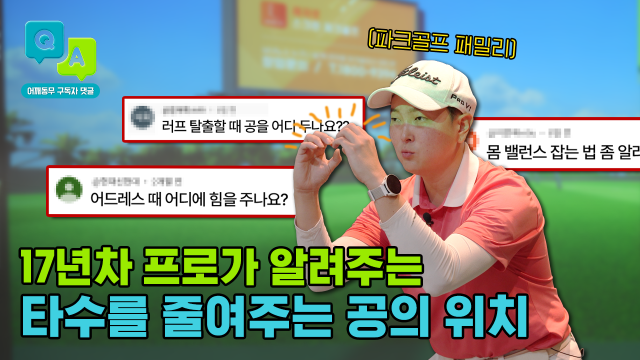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화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없이는 구조적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2006~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의 정규직이 매달 받은 임금 총액은 평균 569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영세 업체 비정규직은 월 120만 8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둘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6년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3만 5000원으로 5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82만 9000원)의 약 4.5배였다. 하지만 지난해 5.45배까지 커졌다.
복지 수준을 봐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두드러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 비용은 지난해 기준 43만 4200원으로 10~299인 기업(15만 1300원)의 3배에 육박한다. 법정 외 복지 비용에는 주거·식사·교통·통신·오락비와 사내 근로 복지 등이 포함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도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유급휴가 수혜를 받은 비중은 38.7%로 정규직(86.9%)에 크게 못 미쳤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율 역시 31.8%로 정규직(68.7%)의 절반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최저임금 유연화 △직무급제 확산 △생산성 제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데는 강한 노동시장이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코로나19 위기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은 해고가 빨랐지만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했고 이것이 소비와 경기 확장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도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급제 확산 또한 절실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격차는 상당 정도 연공적 임금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연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직무·직능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수 대비 실질 부가가치)은 1억 4270만 원으로 대기업(4억 9270만 원)의 29% 수준에 불과했다. 서비스업은 더하다. 서비스업 중기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3230만 원에 그쳐 중소 제조업보다도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 생산성 제고 없는 임금 인상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이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결국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저임금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자영업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협동조합을 활용한 소상공인 규모화를 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올해 기준 37.5%로 정규직(88.1%)에 비해 크게 낮다. 건강보험의 경우 52.2%, 고용보험은 54.7%로 둘 다 가입률이 90%를 넘는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친다. 경인사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vita@sedaily.com